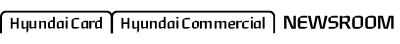[MZ주의] MZ세대의 대안 문화를 보여주는 ‘新힙스터’
견고한 체제를 마주하는 MZ세대 힙스터
2023.04.14
Popular now
1
현대카드, 금융업계 최초 AI 소프트웨어 수출
2024.10.17
2
현대카드의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모두 담은 '2024 현대카드 Tech Talk'
2024.12.06
3
몇박 묵으세요? 지성과 감성 모두 갖춘 다빈치모텔 현장에 방문해봤습니다 (in 이태원)
2024.11.06
4
현대카드,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 AA+ Stable로 상향
2024.11.04
5
현대카드가 금융기업에서 테크기업이 될 수 있었던 비법? 최초 공개합니다 feat. 테크토크 (in 판교)
2024.12.02
미디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활용 시에는 출처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뉴스룸)표기를 부탁 드립니다.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뉴스룸이 MZ세대의 트렌드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해 MZ세대를 들여다보는 ‘MZ주의’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이번에는 힙스터관련된 이야기 입니다. 이전 사회에 대항했던 힙스터와 다르게 MZ세대의 힙스터는 소비로 대한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데요. 김서윤 하위문화연구가가 풀어주는 MZ세대의 힙스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1996년생 A씨는 “아는 힙스터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말에 모두가 그를 떠올릴 만큼 전형적인 힙스터다. 그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의 옷에 스포츠 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명품 브랜드 가방을 메고 다닌다. 대학교는 자전거를 타고 오가는데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인 A씨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대신 싸온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A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것은 평화를 깨는 것이다.
“저는 육식이 평화를 깨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인간은 동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있죠.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 채식을 해요.”
아끼는 자전거에 기대서 이야기하는 그의 귀에는 애플의 무선 이어폰 에어팟이 꽂혀 있었다. 그는 남들과 같은 것도 싫어한다고 말했다.
“저만의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정판을 좋아해요. 좀 고쳐야 할 버릇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한정판을 판매한다고 하면 꼭 구입하는 취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두고 “힙스터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요즘 힙스터라는 말을 쓰나요? 어떤 사람을 두고 힙스터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지금 한국 MZ세대 중에는 ‘힙스터가 없다’.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다. 진정한 의미의 ‘힙스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힙스터를 자청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다.
소비하는 힙스터
‘힙스터’는 대중과는 다른 자신만의 취향을 좇는 사람들로 비주류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1940년대부터 힙스터라는 말은 존재했다. 이 당시 힙스터는 흑인 재즈 뮤지션을 추종하는 백인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일정한 직업이나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재즈만을 즐기던 이 청년들을 두고 1950년대에는 ‘비트닉(beatnik)’이라고도 했다. 비트닉의 주된 정서는 주류에 대한 분노, 저항이었다. 동시에 비트닉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롯된 패배의식, 허무주의, 비관주의 같은 상념에 빠져 있었다. 이 정서들은 1960년대 ‘히피(hippie)’부터 펑크, 레게, 록, 힙합으로 이어지는 하위문화의 근원이다. 하위문화는 반문화(counter-culture)로서, 기저에 기성세대의 안정적인 삶과 주류사회의 보수적인 관념에 저항하는 방탕하고 반항적인 인식을 깔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힙스터는 역사적 힙스터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패배의식과 허무주의 같은 정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체제에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저항하는 힙스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힙스터는 선택한다. 저항의 의미를 가진 소품들을 선택하고, 삶의 양식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개 소비로 실천된다.
‘힙스터’ A씨의 모습을 다시 그려보자. 그를 힙스터처럼 보이게 하는 모든 것은 소비를 통해 갖춰진 것이다. 채식을 실천하기 위해 그는 채식 음식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전거는 200만원 넘게 주고 구입했다. 같은 브랜드 운동화는 10켤레 넘게 가지고 있다. 그가 남과 같지 않게, 현실에 저항하는 방법은 소비다.
거의 모든 힙스터가 그렇다. 일회용 컵 소비를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구입하고, 자가용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를 구입한다. 비건 패션, 비건 화장품 등 자본이 있다면 체제에 저항할 방법이 더 많아지는 현실이다.
왜 지금의 힙스터는 1960년대 히피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히피와 힙스터가 마주하는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MZ세대 힙스터는 오랜 시간 굳어진,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견고한 체제를 마주하고 있다. 체제는 너무 거대하고 명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힙스터는 체제에 순응한다. 반전(反戰)을 노래하며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끝냈던 히피들과 달리 힙스터의 노래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의 힙스터는 최소한의 저항을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힙스터 문화는 저항 문화가 아니라 대안 문화다.
대안 문화로서 힙스터 문화는 특징이 있다. 누구든 힙스터처럼 보일 수 있다.
턴테이블과 LP판을 예로 들어보자. 맨 처음 몇몇 힙스터들은 디지털 부호가 된 음악을 거부하기 위해 턴테이블을 찾았다. 힙스터를 자청하는 34살 B씨가 몇 년 전 턴테이블을 구입했던 이유다.
“요즘은 첫 번째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앨범을 통째로 들어보는 사람이 적어요. 자리를 잡고 앉아 음악에만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도 적고요. 음악 애호가로서 저는 음악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디지털 기기로 듣는 음악 말고 진짜 음악을 듣고 싶어서 턴테이블을 힘들게 구했어요.”
이 ‘힙(hip)스러운’ 행동은 빠르게 복제됐다. 턴테이블도 없지만 그저 소장하기 위해, 진열하기 위해 LP판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알록달록 디자인해 조그맣게 올려 놓을 수 있는 디지털 겸용 턴테이블도 출시됐다.
이처럼 힙스터가 선택한 양식이 흉내내기를 통해 또 다른 하위문화로 자리 잡는 일이 반복되면서 누가 힙스터인지, 힙스터스러운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일이 무의미해지기까지 했다. 이제 힙스터라고 부르는 일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되었다. ‘힙스터’라는 단어가 가끔은 ‘단지 멋부리는 사람’을 대신해 쓰이기도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홍대병’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홍대병이란 힙스터처럼 꾸미고 다니는, 즉 남들과 무조건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비판적으로 부르는 단어다. 힙스터의 정신, 그러니까 사회와 체제에 대한 저항이나 비판 같은 의식 없이 양식만 흉내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부르기 위해 생긴 말이다. 힙스터가 자주 모이던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자주 보인다고 해서 홍대병이란 이름이 붙었다. 개성을 찾다가 오히려 몰개성해지는 모순적인 상황을 두고 ‘홍대병에 걸려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힙스터가 ‘힙스터’라고 불리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인식 때문이다. 누가 힙스터인지 알기 힘든 현실에서 더 이상 힙스터는 없다고 선언해도 무리가 아니다. 대신 힙스터는 부족(部族)이 되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닌다. 어떤 때는 현재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욜로(YOLO)족이 되기도 하고, 디지털 기기 하나만 들고 이곳저곳에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족이 되기도 한다.
MZ세대 힙스터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선택한 양식대로 흩어졌다가 또 다른 지점에서 합쳐지기도 하기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희석되어 가고 있다.
김서윤 하위문화연구가
뉴스룸 카카오톡 채널 안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현대카드∙현대커머셜 소식을
보다 쉽고 빠르게 만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