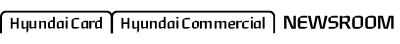색(color), 당신의 아이덴티티가 되다.
신용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에 깔아 둔 '페이(pay)'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만 있으면 웬만한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대형마트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쇼핑이 가능하니 결제 수단으로써 신용카드의 그 '기능'만 이용할 뿐이다. 간편결제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호응하며 모바일 기기를 스마트하게 사용할 줄 아는 이들이라면, 발급 후 지갑 속 신용카드를 꺼내 볼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2018.08.13
Popular now
1
현대카드, 금융업계 최초 AI 소프트웨어 수출
2024.10.17
2
현대카드의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모두 담은 '2024 현대카드 Tech Talk'
2024.12.06
3
몇박 묵으세요? 지성과 감성 모두 갖춘 다빈치모텔 현장에 방문해봤습니다 (in 이태원)
2024.11.06
4
현대카드,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 AA+ Stable로 상향
2024.11.04
5
현대카드가 금융기업에서 테크기업이 될 수 있었던 비법? 최초 공개합니다 feat. 테크토크 (in 판교)
2024.12.02
신용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에 깔아 둔 '페이(pay)'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만 있으면 웬만한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대형마트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쇼핑이 가능하니 결제 수단으로써 신용카드의 그 '기능'만 이용할 뿐이다.
간편결제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호응하며 모바일 기기를 스마트하게 사용할 줄 아는 이들이라면,
발급 후 지갑 속 신용카드를 꺼내 볼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
출처=unsplash.com
그러나 이토록 디지털한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물성(物性)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전자책이 대중화 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종이책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고,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플라스틱 카드들은 새로운 디자인이 출시될 때마다 꾸준히 팔려 나간다. 모바일 기기로 메모하는 것이 디지털 인류로 살아가는 길인 것 같지만, 뜻밖에 만년필과 종이 수첩이 주목을 받는다.
소유는 곧 표현이다. 내가 걸치는 옷은 나의 스타일을 말하고, 내가 고른 물건은 나의 성향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간편함(simplicity)과 이동성(mobility)만이 최우선 가치라면 얇고 가벼우며 저렴한 스마트폰을 고르지 그 외관을 놓고 고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신용카드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내미는 신용카드는 나의 소득 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말해준다. 하물며 디자인까지 남다른 신용카드라면, 제아무리 '간편' 결제가 가능하더라도, 지갑을 열어 꺼내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주체할 수 없을 것이다.
색, 인간과 시대의 상징이 되다출처=unsplash.com
사물의 디자인을 살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요소는 단언컨대 색(色), 컬러(color)이다. 심지어는 어떤 색을 띠고 있느냐를 사물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는 이들도 있다. 색을 스스로를 표현하는 도구로 삼기도 한다. 순백의 바지와 재킷을 고수했던 패션 디자이너 고(故) 앙드레 김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늘 '판타스틱(fantastic)'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흰색은 그의 순수함과 함께 어우러져 앙드레김을 나타내는 심볼(symbol)이 됐다.
이처럼 어떤 색의 물건을 지니거나 자신을 꾸미는데 특정 색을 사용하는 것은 한 사람의 성향을 가늠하게 한다. 색이 일종의 '비(非)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한 사람의 성격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색이 '어떤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인간의 눈과 뇌가 받아들인 느낌'이라는 측면에서, 학자들은 색이 인간의 정신적 특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특정 색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공통된 성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색의 유혹'의 저자 에바 헬러는 "색과 감정의 관계는 우연이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일생 동안 쌓아가는 일반적인 경험, 어린 시절부터 언어와 사고에 깊이 뿌리 내린 경험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색은 개인 뿐 아니라 계급이나 직군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인다. 붉은색이 왕족을 나타낸다거나, 노동자를 블루칼라(blue collar)로 지칭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색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예컨대 지금은 '파랑'이 남성의 색으로 불리지만, 20세기 이전에는 '핑크'가 남성의 컬러였다는 설도 있다.
출처=unsplash.com
전문가들은 색에 대한 해석은 제각기라 하더라도 각 색은 나름의 성격(personality)을 가진다고 말한다. 보편적인 이미지와 콘셉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빨강을 보면 뜨거움·열정·위험 등의 이미지와 함께 불·사과·태양 등이 생각나고, 하양을 보면 순수·무(無)·깨끗함 등의 개념과 함께, 종이·백조·눈(snow) 등이 떠오르는 것을 보라. 색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이자, 사물이나 현상을 설명하는 매개체가 된다. 심지어 스위스의 심리학자 막스 루셔(Max Luscher)는 “색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반한 색채 테스트를 통해 인간의 성격뿐 아니라, 인격의 숨겨진 구조, 심지어는 범죄경향까지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컬러로 라이프 스타일 프리미엄을 새롭게 정의하다대부분의 사람이 색의 성격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색은 나를 드러내는데 매우 용이한 개념이다. 때문에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색채의 특성에 기반한 마케팅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강렬한 붉은색을 로고에 사용한 코카콜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등장한다. 탄산이 가득한 시원한 음료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코카콜라를 들고 마시는 사람 역시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unsplash.com
컬러의 활용도가 낮았던 분야에 컬러 콘셉트를 도입해 성공을 거둔 경우도 있다. 'the Black' 'the Purple' 'the Red'에 이어 최근 'the Green'을 출시해 이른바 '컬러 시리즈'를 선보인 현대카드가 대표적이다. 시장에서 통용되던 '플래티넘' '골드' '실버'라는 천편일률적인 프리미엄 등급 체계에 과감히 색을 도입한 것. 독보적인 컬러 디자인을 적용해 신용카드를 내미는 것 만으로도 나를 드러낼 수 있게 만들었다. 신용카드의 본질을 '결제'에서 사용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확장한 것이다.
현대카드가 선택한 컬러들은 각 색의 성격과 해당 카드를 사용할 타깃(target) 고객의 아이덴티티(identity)와 절묘하게 맞닿아 있다. 가령 ‘the Black’의 경우 검정이 가지는 ‘절대적(ultimate)’ ‘사람을 사로잡는(charismatic)’ ‘위엄있는(dignified)’ ‘부유한(wealthy)’ 등의 성격을 고려해 오피니언 리더로서 사회를 이끄는 지위에 올라 있으면서 동시에 부를 갖춘 상위 0.05% 이상의 VVIP를 위한 카드에 적용했다. ‘the Purple’ ‘권력(power)’ ‘특권 있는(prestigious)’ ‘귀족적인(noble)’ 등의 보라색이 가지는 이미지를 차용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이나 기업 임원급들에게 발급했다.
'the Red'부터는 사회적으로 새롭게 정의되는 '프리미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됐다. 전통적인 '프리미엄'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4050을 주요 타깃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소비 주도층으로 트렌드를 선도하는 3040 직장인을 '뉴(new) 프리미엄' 정의하기로 한 것이다. 붉은색이 가지는 '성공을 갈망하며(strive for success)' '열정적이고(passionate)' '주목을 끌고 싶은(attention seeker)' 등의 성격은 이들의 정체성을 대변하기에 충분했다.
the Green
지난 7일 출시한 'the Green'은 소득 수준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규정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소비 세대의 출현에 응답하는 신용카드다. 도래하지 않은 미래와 전형적인 부의 개념을 거부하고, 현재와 경험 그리고 뚜렷한 나만의 무엇에 올인(all-in)하는 이들이 더 합리적으로 나만의 사치를 구현해 낼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녹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live their lives by their own standards)' '정해진 틀을 벗어나기를 좋아하며(like to leave systems)' '사생활을 중시하고(value their privacy)' '자신을 잘 아는(know yourself very well)' 등의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녹색만큼 적합한 컬러는 없었다.
출처=unsplash.com
“나만의 색깔을 표현하라." 수많은 셀프 브랜딩(self-branding) 도서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다. 대체 나만의 색이란 무엇일까? 영화 감상이나 독서가 아닌 범상치 않은 취미를 갖거나, 유행과는 거리가 먼 패션 스타일을 가졌다면 색이 있는 사람인 걸까. 어찌됐든 색이란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스타일, 즉 단순한 물리적인 콘셉트를 넘어선 한 존재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무엇이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에게서 영감을 주고 받으며 형형색색의 색으로 사회 곳곳을 물들인다.
스스로를 표현하고 나를 정의하려는 개인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다양한 색의 출현을 낳을 것이다. 매년 '올해의 컬러'를 선정하는 미국의 색체 전문기업 팬톤(Pantone)의 로리 프레스만 회장의 말은 색이 곧 아이덴티티의 상징이라는 점을 잘 드러낸다. "'올해의 컬러'는 세계 디자인 트렌드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 그 시대의 니즈(needs)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