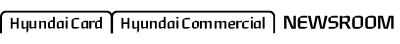현대카드·현대커머셜 뉴스룸
컨텐츠 바로가기
[GQ] 너의 얘기를 먹고 싶어
보편적인 직장인들에게 밥을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2017.11.15
Popular now
1
현대카드, 금융업계 최초 AI 소프트웨어 수출
2024.10.17
2
현대카드의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모두 담은 '2024 현대카드 Tech Talk'
2024.12.06
3
몇박 묵으세요? 지성과 감성 모두 갖춘 다빈치모텔 현장에 방문해봤습니다 (in 이태원)
2024.11.06
4
현대카드,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 AA+ Stable로 상향
2024.11.04
5
현대카드가 금융기업에서 테크기업이 될 수 있었던 비법? 최초 공개합니다 feat. 테크토크 (in 판교)
2024.12.02


고(故) 신해철이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 바늘 보면서’라며 밥 먹는 도시의 직장인을 노래한 게 벌써 지난 세기다.
그 사이 모두가 월요일엔 냉장고를 부탁하고, 화요일엔 백선생님의 가르침 아래 집밥을 해먹고, 수요일엔 미식회를 열면서 떠들썩하게 사는 듯 보여도, ‘기계 부속품처럼 큰 빌딩 속에 앉아 있는, 구겨진 셔츠의 샐러리맨’들의 밥 먹는 시간은 지난 세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가회동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치로 올리보의 오너 셰프였고, 반얀트리호텔의 총주방장이었던 김형래 셰프가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이하 현대카드)의 수석 셰프가 되어 회색빛 빌딩으로 가득한 여의도로 옮겨온 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이다. 사람들은 ‘고메 위크’나 ‘쿠킹 라이브러리’처럼 미식의 지평을 넓히고 요리를 통해 감각을 깨우는 현대카드의 대외적인 프로젝트에 열광하지만, 사실 현대카드 기업문화팀의 ‘과장님’이기도 한 김형래 셰프에게 주어진 고객은 이 회사 사원증을 목에 걸고 매일 같은 시간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평범한 직원들이다.
회사는 그들의 밥 먹는 시간이 평범해지기를 바라지 않았다.

김형래 셰프는 현대카드에 온 이후, 음식이 있는 자리의 ‘스토리’와 ‘히스토리’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회사에 ‘홈 앤 어웨이’라는 기업문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로 다른 팀끼리 만나 그 동안의 오해를 풀기도 하고, 서로 힘을 합치기로 약속하기도 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위해 요리를 할 땐, 왜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술 한 잔을 같이 마시는지 먼저 알아야 해요. 그 후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나 성별 구성은 어떠한지, 심지어 자유롭고 편한 시간인지 혹은 다소 경직된 자리인지까지 파악해야 하죠.”
어떤 음식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은 그 이후에야 시작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 때의 좋은 음식이란 ‘얼마나 맛있나’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막걸리와 파전이, 어떤 경우에는 치킨과 맥주가 필요하다.
김형래 셰프는 이제 ‘음식’이란 단어에 ‘먹는다’보다 ‘나눈다’ 혹은 ‘이야기한다’라는 서술어가 더 어울릴 때가 많다는 걸 안다. 회사의 셰프들이 반조리한 음식과 레시피를 준비해, 직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요리해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아임 셰프’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였다. 처음에 셰프들은 구하기 어려운 좋은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혹은 비싸서 접근하기 어려운 메뉴를 중심으로 생각했다. “만약 스테이크가 주요 메뉴라면, 당연히 최고급의 고기를 많이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의외로 직원들은 고기의 양보다는 한 개의 박스 안에 스테이크뿐만 아니라 샐러드와 디저트 그리고 레시피까지… 박스를 열었을 때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많은 회사가 직원들의 삶 중 일하지 않는 시간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직원들이 회사 밖으로 그 박스를 들고 나가 가족, 친구, 연인 앞에서 열었을 때는, 분명 전에 없던 이야깃거리가 생겨났을 거고, 그 순간만큼은 행복을 누렸으리란 건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여기선 재료 마련 등 음식이 완성되는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 현대카드 옥상엔 초록색 텃밭과 노란색 벌통이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각종 과일과 채소와 허브 그리고 꿀을 직접 수확해 재료로 사용하는 건 그런 이유다. 물론 직접 기른 재료가 요리의 일부로서 가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재료가 다듬어진 상태로 도착하면, 셰프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적어요. 백화점에 가보면 온갖 식재료들이 예쁘게 똑똑 잘라져 있고, 고기도 기름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료를 자유롭게 요리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죠.” 물론 직접 기른다고 해서 무조건 더 신선한 것도 아니고, 사실 눈 감고 먹어보면 구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직접 기른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건 사실 두 번째예요. 그보다는 우리 회사에서 직접 키운 재료를 오직 직원들에게 제공한다는 그 특별함이 큽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낯간지러운 이야기를 옥상에서 자란 과일, 채소, 허브, 벌꿀로 대신하는 셈이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말이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회사가 직원에게 마음을 건넬 때 말은 가장 닿기 어려운 수단이고, 그 자리를 훌륭하게 대신해주는 매개체로 음식만한 건 없을 것이다.
사실 음식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갖다 붙이지 않아도, 맛있는 요리는 그 자체로 이야기의 기원이 되기도 한다. 김형래 셰프는 마침 1박 2일에 걸쳐 부산에 다녀온 길이었다. 현대카드엔 모든 직원들이 자유롭게 모여 한 손엔 맥주, 한 손엔 음식을 들고 별로 대단치 않은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Happy Hour’란 시간이 있다. 올해부터는 ‘Meet & Eat’이란 이름으로 그 만남을 전국의 사옥으로까지 확대했다. 케이터링 업체는 절대 쓰지 않겠다는 회사의 결정 덕분에 1시간 30분의 행사를 위해 최소 1박 2일의 시간을 들여 준비하곤 한다. 지난주 부산 사옥에선 로스트 비프를 메인 메뉴로 결정한 까닭에, 전날 오후부터 등심을 마리네이드해서 밤새 숙성시키고 또 한 시간 반에 걸쳐서 굽느라 1박 2일도 빠듯했다. 시간과 마음을 들인 음식은 누구라도 알아차릴 수 있다. 그 날 직원들은 로스트 비프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단체 채팅창에 올리며, 일하느라 미처 오지 못한 사람들마저 식당으로 끌어냈다.
덕분에 원래 180명이 오기로 했던 자리엔 200명 가까운 직원이 모였다. 맨 처음 조용히 자리에 앉아 먹는 데만 집중하던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취기가 오르자, 점차 웃고, 떠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빈 접시는 쌓여 가고 식당은 북적거린다. 아마 그 날 처음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눈 동료들 덕분에, 그 다음날부터 회사의 데시벨이 평소보다 조금 더 높아졌을 거다.


다시 신해철의 노래 ‘도시인’으로 돌아가보면, 우리는 ‘직장이란 전쟁터, 회색빛 빌딩들’에서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이다.
어쩌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은 시간, 무채색 빌딩에서, 모두가 비슷한 옷차림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와, 밥을 먹는 데 급급한 외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음식은 그 자체로 이야기를 안고 있고, 이야기의 기원이 되며, 때로는 이야기가 오가는 길목이 된다. 그래서 음식은 우리를 ‘직장이란 전쟁터, 회색빛 빌딩들’ 사이에서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은 사람들’로 만들어준다. 음식이 그렇게 음식 이상이라는 걸, 이미 우리는 회사 밖에서 알게 된 지 오래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의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일터에서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에디터 글 / 김호연(프리랜스 에디터)
ⓒ GQ,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